한글날 [Hangeul Day]
한글날 정보: 행사 일정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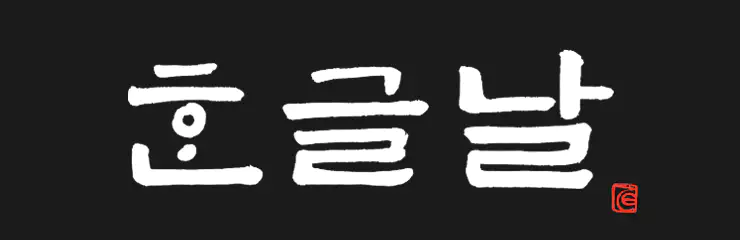
- 명칭: 한글날 (Hangeul Day)
- 날짜: 매년 10월 9일
- 성격: 대한민국 국경일
- 기념 대상: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훈민정음 창제 및 반포
- 유래: 1926년 ‘가갸날’ 제정 → 1928년 ‘한글날’ 개칭 → 1945년 광복 후 10월 9일 확정 → 2006년 국경일 지정
- 의의: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기리고 민족문화 발전의 토대를 기념
- 세계적 인정: 훈민정음 해례본,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관련 인물: 세종대왕, 집현전 학자 정인지 등
- 대표 행사:
- 정부 주관 기념식
- 한글 관련 학술대회 및 전시회
- 국어 발전·보급 공로자 포상
-
2025년 한글날 행사:
- 2025 한글날 기념행사 – 제579돌 국립한글박물관 <한글 한마당>
- 기간: 2025년 10월 9일 ~ 10월 14일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야외광장(10월 9일), 광화문광장(10월 11~14일)
- 주관: 국립한글박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이 주관하는 <한글 한마당>이 열린다. 10월 9일 국립중앙박물관 야외광장에서는 ‘도전! 한글 돌림판’, 경찰·기업과 함께하는 체험 부스, 기념품 증정 등이 진행된다.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는 VR 체험, 한글 전등·열쇠고리 만들기, 한글 문제 맞히기, 공연과 전시 등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가 펼쳐진다.
10월의 공기는 언제나 맑고 단정하다. 들판에는 벼가 고개를 숙이고, 바람은 유난히 투명하다. 그 가운데 10월 9일, 대한민국은 하나의 기념일을 맞는다. ‘한글날(韓글날)’.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것을 기리는 날이다. 하지만 이 하루는 단순히 “글자를 만든 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말과 생각을 스스로의 언어로 기록할 수 있게 된 날이며, 우리를 우리답게 만든 문명의 출발점이다.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창제 – 한글날의 기원
시간을 거슬러 15세기로 돌아가보자. 조선은 성리학을 국시로 삼은 중앙집권 국가였고, 지식과 권력은 한문(漢文)을 독점한 사대부 계층이 쥐고 있었다. 백성들의 말과 삶은 한문으로 온전히 옮길 수 없었고, 글자를 몰라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세종대왕(재위 1418–1450)은 이 불평등을 누구보다 깊이 느꼈다. 그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펴지 못한다”고 말하며, 백성이 스스로 말하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 것을 결심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1443년 창제되고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訓民正音)이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지닌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말 없는 자들에게 말을 주고, 배제된 자들을 세계 안으로 초대한 혁명이었다. 세종은 글자를 ‘지식인의 도구’에서 ‘모든 이의 권리’로 돌려놓았다.
훈민정음 제자 원리 – 소리의 구조를 담은 문자
훈민정음은 28자의 자모로 구성되었고, 소리의 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만든 문자였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ㅡ), 사람(ㅣ)의 삼재(三才)를 본떴다. 문자는 더 이상 신의 은총이나 신비로운 부호가 아니었다. 인간이 세계를 관찰하고 이성으로 재구성한 질서였다.
이 과학성과 체계성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언어학자들의 찬탄을 받는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은 훈민정음을 “세계 문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창제”라고 평가했고, 유네스코는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이는 한글이 단지 한 나라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한글날 유래와 역사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변화
한글날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고 굴곡졌다. 1926년,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와 민간 단체들이 세종 480돌을 맞아 처음으로 ‘가갸날(가나다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일을 열었다. 이후 ‘한글날’로 이름을 바꾸고, 광복 이후 1949년에는 공식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한때 경제 논리를 이유로 공휴일 지위가 박탈되기도 했지만, 2013년 다시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복원되었다. 그 과정은 마치 한글이 시대의 굴곡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온 역사와 닮아 있다.
한글날의 뜻과 가치 –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다
한글날은 단순히 문자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그것은 ‘말’과 ‘글’이 단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임을 상기시키는 날이다.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단지 말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설명하고, 세계를 해석하며, 기억을 전승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글이 탄생하기 전, 조선의 백성들은 자신을 기록할 언어를 갖지 못했다. 한글의 창제는 곧 “나는 말할 수 있다”는 선언이자, 존재의 서막이었다.
한글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적이다. 귀천과 성별, 배움의 정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워 쓸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이다. 세종이 꿈꾼 세계는 바로 그것이었다 — 언어의 평등이 보장되는 세상, 말 없는 자들이 말하는 세상.
오늘의 한글 – 우리가 다시 쓰는 문자
10월 9일, 우리는 한글을 다시 생각한다. 스마트폰 자판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문장을 쓰고, 수많은 텍스트를 읽고 쓰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이 글자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을까.
한글날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묻는 날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그 말은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 속에 숨어 있다.
글자는 단지 소리를 옮기는 기호가 아니다. 그것은 생각의 몸이며, 우리가 사는 세계의 구조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통해 열어젖힌 세계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도 이 글자를 통해 새로운 말을 만들고, 새로운 생각을 기록하며, 새로운 세계를 써 내려가고 있다.
10월의 맑은 하늘 아래, 한글을 다시 읽는 일 — 그것은 단지 문자 하나를 기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쓰는 일이다.
Philosophy & Thought
Literature & Classics
History & Society
Designer Toys
Cultural Events